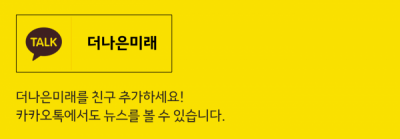환경재단, 국내 최초 ‘채식영화제’ 열어
채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현재 국내 채식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인 1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채식 인구가 늘면서 사람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과거 소수의 문화로 여겨졌던 채식이 주류 문화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재단은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국내 최초로 채식을 주제로 한 영화제를 지난 달 29일 개최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에서 열린 ‘2018 채식영화제’에는 이틀이라는 짧은 영화제 기간에도 무려 10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채식은 나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일”
올해 ‘채식영화제’에는 독일 다큐멘터리 ‘100억의 식탁’을 비롯해 ‘고기를 원한다면’(네덜란드), ‘나의 언덕이 푸르러질 때’(프랑스) 등 세계 5개 국가에서 제작된 작품 6편이 초청됐다.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배지테리언(vegetarian)의 어원은 ‘온전한’ ‘건강한’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베게투스(vegetus)”라며 “채식에 대한 관심은 ‘나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영화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개막작인 ‘100억의 식탁’은 ‘우리의 식탁에 어떤 음식을 올릴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인류학자에 따르면, 오는 2050년이면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에 이르게 된다. 인류는 세계 기아를 막기 위해 농업을 고도화시켜 더 많은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정작 세계 곡물 생산량의 약 70%는 동물 사료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사람들이 육식 위주의 식단을 추구하면서 동물 사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 탓이다. 영화는 주민이 먹을 작물 대신 동물 사료로 수출할 콩을 재배하는 모잠비크 주민들의 생활과 독일·영국·미국에서 일어나는 도심 농장 프로젝트를 대비하며 ‘지속가능한 음식 생산’에 대한 묵직한 고민을 던진다.

◇‘착한 식습관’ 고민하는 사람들, 채식에 빠지다
채식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출발한다. 이번 영화제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역시 그랬다. 29일 개막식을 찾은 한수정(31·서울 강동구)씨는 “과식을 막는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채식을 시작했다”면서 “하루 한 끼는 꾸준히 채식하고, 휴일에는 육류 식단을 가급적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식영화제 개최 소식을 듣고 강원 춘천에서 왔다는 서영숙(52)씨는 “채식을 단순히 건강이라는 차원에서만 생각해왔는데, 고기 섭취 인구가 늘면 동물 사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결국 동물과 식량 경쟁을 하는 빈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채식 단계가 엄격한 사람일수록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에 대한 고민이 깊은 편이다. 채식에 달걀만 섭취하는 김수창(25·서울 양천구)씨는 “알레르기 때문에 유제품을 먹지 못했는데, 작년 이맘때부터 ‘착한 식습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높은 단계의 채식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영화제 상영작을 보면서 제철음식에 대한 구분이 없는 육고기를 매일 추구하는 삶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채식은 먹는 음식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데, 동물성 식재료를 일절 먹지 않고 채소와 과일만 섭취하는 경우 ‘비건(vegan)’이라고 부른다. 김씨처럼 채식을 하면서 달걀만 추가해 먹으면 ‘오보(ovo)’라고 한다. 채식에 유제품만 섭취하면 ‘락토(lacto)’, 여기에 해산물과 어패류를 추가하면 ‘페스코(pesco)’라고 부른다.
이번 영화제의 상영작 선정 업무를 총괄한 맹수진 프로그래머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그리고 인류의 식량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채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