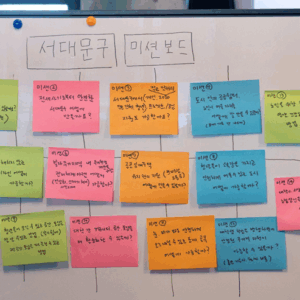“국제적으로는 워낙 잘 알려진 NGO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옥스팜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재미를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통신기업과 비영리단체를 거치며 ‘NGO’ 와 ‘디지털’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박재순(사진) 옥스팜코리아 디지털마케팅팀 차장은 요즘 일하는 맛에 푹 빠져있다. 영국에서 시작한 국제구호개발 전문 NGO 옥스팜에 입사하면서 부터다. 옥스팜은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목표로 활동해왔으며, 지난 2014년 우리나라에도 정식으로 사무소를 설립했다. 현재 12명의 직원이 한국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다. -옥스팜은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가? “글로벌 NGO의 주요업무는 ‘긴급구호’ ‘국제개발’ ‘캠페인’ 세 가지로 나뉜다. 옥스팜은 기본적으로 긴급구호와 국제개발에 대응하면서, 가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캠페인에도 힘을 쏟고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를 가르치라’는 말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물가에서 고기를 잡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옥스팜의 관점이다. 불공정한 가난은 후원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의 개혁과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옥스팜은 이 같은 목소리(캠페인)를 통해 정부와 지역사회를 바꾸고자한다.“ -어떻게 옥스팜에서 일하게 됐나? “대학에서 미디어통신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이동통신사에서 데이터센터 운영, 웹 기획자 등으로 7년간 일했다. 그러다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되면서 후원자로 있던 어린이 양육 전문 NGO로 이직했다. 봉사나 후원을 넘어 ‘세상에 이로운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연계는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데, 왜 사람이 소유한 자원이나 힘은 그렇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 의문도 이직에 한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