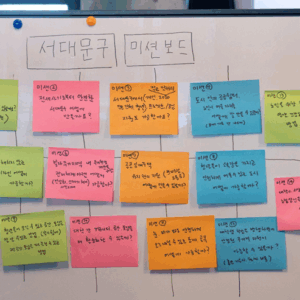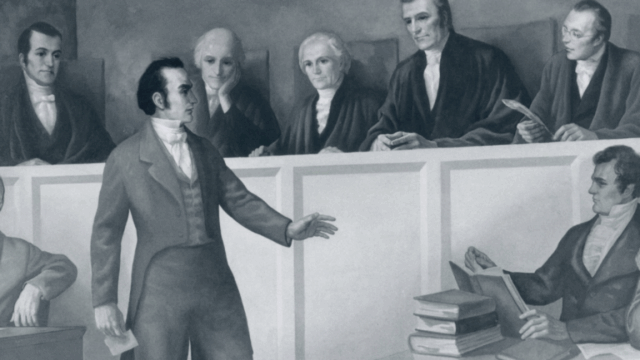2017 글로벌 사회공헌 포럼 현장… ‘협력하는 힘, Collective Impact’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 10주년 기념 한국 기업들의 사회공헌 수준은 어디까지 왔을까. 우용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 소장은 “과거엔 기업들이 단순 기부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우 소장에 따르면, 기업들이 사회복지나 재난 구호 등에 쓴 사회 공헌 지출 총액은 2006년 1조8048억원에서 2015년 2조9020억원으로 60% 늘어났다. 매출액 대비 사회 공헌 활동비 지출 비율은 같은 기간 0.12%에서 0.19%로 증가했다. 이는 미국(0.11%)이나 일본(0.09%) 기업보다 더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업의 사회공헌이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할 때가 왔다”고 지적하면서 “사회공헌의 질적 성장을 위해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사회문제가 복잡 다양해짐은 물론 사회공헌의 평가기준이 ‘시행여부’에서 ‘임팩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공헌 협력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지난 28일 정부, 기업, NGO,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공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사회복지협회 사회공헌정보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력의 힘,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라는 주제로 ‘2017 글로벌 사회공헌 포럼’이 개최됐다. ◇“‘조율’이 콜렉티브 임팩트에 힘 실어준다” 기조연사자로 나선 필립 시온(Philippe Sion) FSG 매니징 디렉터는 “단순히 협력의 여부 보다 의제에 따른 협력 모델을 설정하고, 검증 과정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FSG는 공유가치창출(CSV, Created Shared Value) 개념을 처음 주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