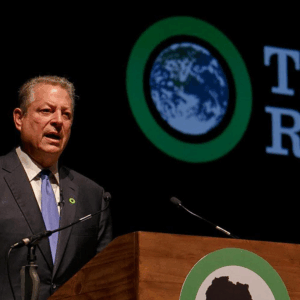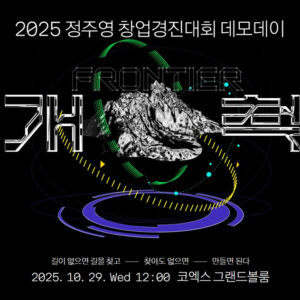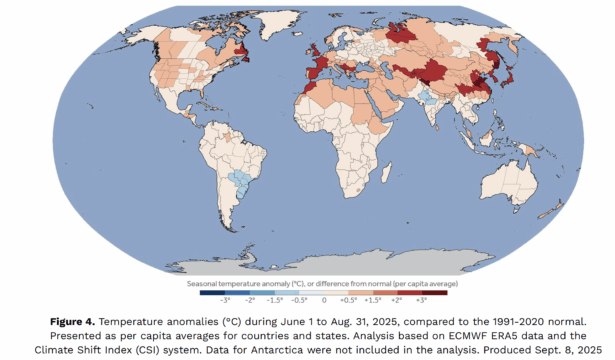인체조직기증 활성화하려면…
피부 이식재 구매와 수술에 드는 비용 1억5000만원으로 경제적 부담 커
인체조직이 ‘공공재’인 스페인 경제력 상관없이 이식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는 78% 이상 해외 수입에 의존 사후기증·장기 보관 등에 인식 개선해야
2012년 7월 강원도 삼척의 한 교회에서 가스 누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김한빈(13)군은 몸의 80%에 중화상을 입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김군을 구한 건 누군가가 사후에 기증한 ‘피부 조직’이었다. 10번이 넘는 대수술을 거쳐 김군은 얼굴과 몸에 새로운 피부를 이식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속적으로 재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 사고 후 김군의 입원부터 피부 이식재 구매와 수술에 든 비용은 1억5000만원. 자라나는 뼈에 맞춰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화상 부위에 피부를 재이식해야 하는 까닭에 앞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외국의 경우엔 어떨까.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선진국인 스페인에선 뼈나 피부, 연골 등과 같은 ‘인체조직’ 비용을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인체조직을 ‘공공재’로 규정, 꼭 필요한 사람들이 경제력에 상관없이 이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환자에겐 피부 조직 가공이나 수술 등에 들어가는 ‘실비’만 부과된다. 단 ‘모든 국민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면 줄 의무도 있다’는 원칙으로 인체조직 기증 또한 활발히 이뤄지도록 한다. “기증하지 않겠다”고 미리 못 박은 사람만 빼면 나머지는 모두 기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아웃(opt-out)’ 시스템이다.

◇생명을 살리는 ‘인체조직’, 기증 낮아 거의 전량 수입해
“수술받은 다리로 땅을 처음 내딛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년 만에 새 다리를 선물 받은 거죠.”
1993년 당시 열두 살이었던 황연옥(34)씨는 왼쪽 다리에 인공관절을 이식받았다. 뼈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희귀 소아암 ‘골육종’ 때문이었다. 이식받은 인공 관절로는 다리를 구부리는 게 불가능했다. 수차례의 병원 치료와 절뚝거리는 다리로 살아온 지 20년 만인 지난 2012년 다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황씨는 인공 관절이 부식돼 부러졌다는 걸 알았다. 주변의 원래 뼈까지 약해져 인공 관절을 재이식하기도 어려운 상황. “앞으로 걷기 어려울 것”이라던 황씨를 도운 건 누군가가 기증한 뼈였다. 인공 뼈와 달리 사람의 뼈는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 ‘제 것인 양’ 자리를 잡는다. 수술 이후 황씨는 무릎을 굽히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녀가 두 다리로 걷던 날 부모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황씨는 “누군가가 남긴 뼈로 20년 만에 새 다리를 선물 받았다”며 “나 또한 그 누군가를 위해 사후 기증하기로 했다”고 했다.
화상으로 손상된 피부나 골육종과 같은 뼈암 등을 치료하기 위해선 피부·뼈와 같은 인체조직이 필요하다. 인공재로도 대체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조직을 이식하는 편이 부작용도 적고 훨씬 효과적이다. 이러한 ‘인체조직’도 기증이 가능하다. 인체조직이란 사람의 몸에서 장기에 속하지 않는 부위다. 뼈나 피부, 인대, 혈관, 각막 등이 대표적인 예다. 혈액형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명까지도 도울 수 있지만 국내에선 인식 부족으로 기증률이 낮다. 미국은 인구 100만명당 133명이 기증하고 스페인은 59명이 기증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4.7명만이 기증한다. 박창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이사장은 “희귀 뼈암이나 잇몸 수술, 화재 사고로 인한 화상 환자 등이 늘면서 인체조직에 대한 수요는 2007년 14만400여건에서 6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며 “하지만 기증률이 낮다 보니 지난해 유통된 30만건의 이식재 중 78%가 해외에서 수입됐다”고 말했다.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외국 통상 가격의 최소 1.5배 이상이 든다. 온몸에 피부를 이식해야 하는 전신 화상 환자의 경우 한 번에 피부 이식재 구매에만 최대 5000만원대까지 비용이 든다.

◇비윤리적 출처, ‘돈’에 사고팔리는 ‘생명’
‘인체조직’이 ‘상품’으로 거래되다 보니 ‘생명 윤리’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생명이 ‘돈’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 실제로 혈액이나 장기의 경우 ‘매혈(買血)’과 ‘장기 매매’ 같은 시장 거래가 오래전에 금지됐지만 인체조직은 여전히 상품으로 거래되는 상황이다. 상품화된 상태로 거래돼 출처가 불분명하다 보니 ‘안전성’ 우려도 있다. 간염이나 에이즈 바이러스(HIV), 광우병 등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조직도 비밀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수차례 이어졌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인체조직 이식으로 인한 1352건의 감염 사례가 파악됐고, 이 중 40명이 사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인체조직이나 장기와 같은 ‘인체 유래물’은 ‘비영리’로 이뤄질 것”과 “각 나라의 수요는 각 나라에서 충족시킬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인체조직 기증자는 248명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체조직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관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인체조직도 혈액이나 장기처럼 기증·이식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과거 시장 거래에 맡겼던 혈액 관리를 대한적십자사에서 위탁·총괄하면서 안전한 혈액을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비슷한 사례다. 아직 갈 길은 멀다.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2013년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국민의 99%가 헌혈과 장기 기증을 알고 있지만, 인체조직 기증을 아는 사람은 39%에 불과하다. 인체조직 기증 서약자 또한 14만2704명(2013년)으로 장기 기증 서약자 77만8209명에 비해 5분의 1밖에 안 된다. 박창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이사장은 “앞으로 인체조직이 공공재가 됨으로써 환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 지면서 더욱 안전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인체조직 기증은 돈과 시간 이상의 ‘생명’을 나누는 또 다른 형태의 ‘나눔'”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