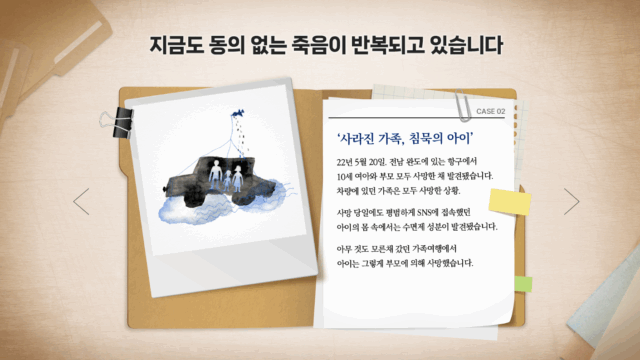점과 점을 잇는 최단의 거리는 직선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선에 가까운 커리어 패스를 원하고 최단 시간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한다. 최연소 합격, 최연소 졸업.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추앙하는 단어다. 그러나 왜 빨리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왜 커리어 패스가 꼭 직선이어야 하는가. 공익을 추구하고 문제와 사람을 우선하면 효율적인 커리어 패스를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문제를 풀고 사람을 돕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배움에 갈증을 느껴 학교로 갈 수도 있다. 학교로 갔다가 현장이 그리워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한 직장에 갔다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공익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직업이나 직장은 커리어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궁극적 목표는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직업과 직장은 그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목표는 일관되더라도 그 목표를 추구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환경에 따라 바뀐다. 그러다 보면 커리어 패스가 직선을 이탈한다. 빈곤과 불평등을 줄인다는 내 목표는 바뀐 적이 없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은 계속 달라졌다. 한때는 대학교수였고, 또 다른 때에는 데이터 과학자였다. 지금은 둘 다이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나의 첫 직업은 한국의 대학교수였다. KDI 정책대학원에서 1년간 일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 코드 포 아메리카의 데이터 과학자로 근무했다. 코드 포 아메리카는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 기술(civic tech) 단체다.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기술, 디자인, 데이터를 통해 미국의 복지 시스템을 시민들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