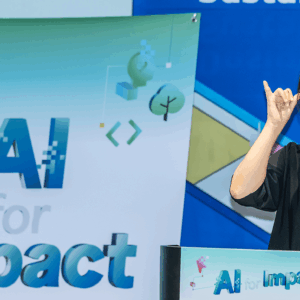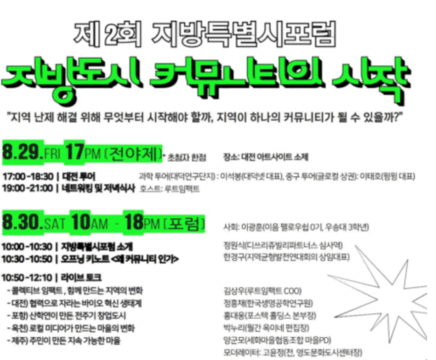제5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기획하는 이혁상 프로그래머 인터뷰 이민자, 난민을 넘어 사회적 소수자 껴안는 ‘디아스포라 영화제’ “‘제 존재 자체가 디아스포라(Diaspora∙이주민) 아니겠느냐’면서 ‘당신의 시각으로 영화제를 꾸려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 사회에서 ‘유랑하는 존재’들을 안아주는 영화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맡게 됐어요. 다음 영화 준비하려면 아르바이트도 필요했고요(웃음).” 제 5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기획을 총괄한 이혁상<사진> 프로그래머의 말이다. 그를 만난 건, 지난 19일 인천영상위원회 사무실에서였다. 5회를 맞이하는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올해를 기점으로 한층 풍성해졌다. 3일이었던 영화제는 5일로 늘어났고, 상영작도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4년간 ‘영화제 평이 좋았던’ 까닭에 올해부터 인천시 지원 예산이 훌쩍 뛰었기 때문이다. 올해, 영화제 전반을 기획하는 프로그래머로 새롭게 참여하게 된 이혁상 감독은 “‘디아스포라’ 라는 주제로 상영작 50편을 다 채울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규모도 커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망명했거나 이주한 난민, 재외 동포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머물던 공간에서 밀려난 이들, 차별이나 혐오로 인해 주변부에서 떠도는 이들 모두가 우리 시대의 ‘디아스포라’인 셈이거든요. ‘디아스포라’가 생소해 보여도 실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살던 곳을 떠나 온 난민∙탈북민, 재개발이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뿌리내렸던 ‘공간’에서 떠나야 했던 이들. 그 외에도, 혐오와 차별 시선으로 사회 ‘비주류’로 떠밀리는 이들 모두가 우리 시대의 디아스포라였다. “‘디아스포라’가 우리와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난민 문제만 해도, 아직은 다른 나라 일 같이 들리겠지만 우리 이야기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3국에서 한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