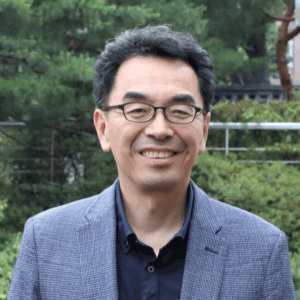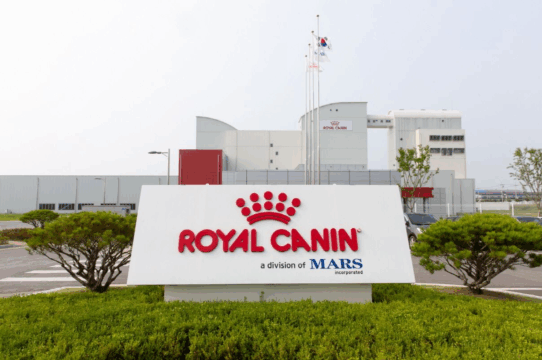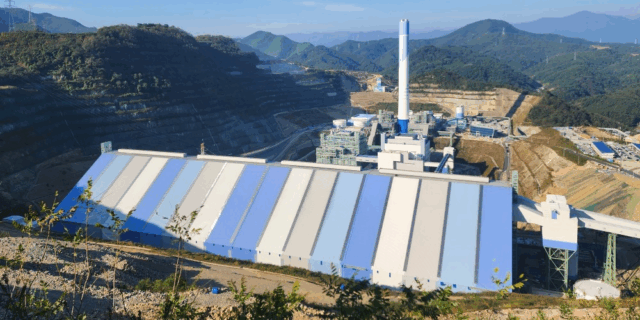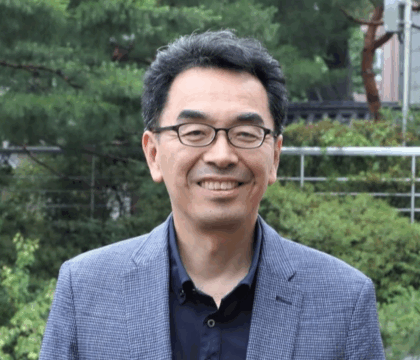장애인의 형제들이 만든 자조 모임 ‘나는’

‘나는'(nanun.org)은 정신장애인을 형제로 둔 20~30대 청년들의 자조 모임이다.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로서 함께 고민하고 의지할 모임이 필요했던 두 청년이 2016년 ‘나는’을 탄생시켰다. ‘나는’의 모임에서는 장애인 형제에 대해, 부모에 대해, 세상의 시선에 대해 대화하거나 에세이를 쓰며 치유 시간을 갖는다. 지난 21일, 운영진 박혜연·이은아·설지영·송서원씨 네 사람을 만나 ‘나는’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직접 모임을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비장애 형제 자조 모임이 어딘가 하나쯤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친구인 지영씨와 의논한 끝에 ‘없으면 우리가 만들자’고 결론을 내렸어요. 지인들을 통해 모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았고, 혜연, 서원씨를 만나게 됐죠.”(이은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네 사람은 가까운 친구나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과 감정을 생전 처음 털어놓으며 그동안 눈치 채지 못했던 마음의 생채기들을 발견하게 됐다. “모임에 참여하기 전까지 스스로 ‘나는 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잘 소화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답답함이 쌓여 있었다는 걸 깨닫고 굉장히 당황했죠. 펑펑 울었어요.”(박혜연)
눈물 뒤에 찾아온 건 따뜻한 위안. 부모가 장애인 형제를 더 먼저 챙길 때 느끼는 서운함, 나만큼은 부모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인 형제에 대한 미움과 같은 복잡한 감정을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들도 느낀다는 데서 오는 온기였다.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을 만나 강한 연대감을 느꼈어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달까요.”(송서원)
‘나는’의 대화 모임과 글쓰기 모임의 목적은 자신을 스스로 ‘장애인의 형제’로 규정하며 살아온 비장애 형제들에게 오롯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장애인 형제를 둔 비장애인 중에는 ‘나는 이렇게 멀쩡하니 이만하면 괜찮지, 살 만해’ 하면서 자신은 힘들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는 너무 힘든데도요. ‘나는’에서는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법을 함께 익혀가고 있습니다.”(설지영)
장애인 형제의 보호자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희가 장애인 형제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련 법, 제도 등을 챙겨야죠. 그런데 장애인의 비장애인 형제에게는 보호자로서 권한이 거의 없더라고요. 답답할 따름입니다.”(박혜연) ‘나는’이 정서적으로 연대하는 자조 모임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해지고 있다. “불합리한 장애인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는’이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또한 ‘나는’의 역할이 아닐까요.”(송서원)
‘나는’의 올해 목표는 ‘지속 가능성 확보’. “지금은 서울과 부산에서만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활동 모델을 체계화해서 지역 곳곳으로 확산하고 싶어요. 또 대화 모임과 글쓰기 모임을 수익 창출이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 소셜 벤처를 창업할 계획도 논의 중입니다.”(이은아)
네 사람이 금쪽같은 주말을 몽땅 투자해 ‘나는’ 활동을 4년째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비장애 형제가 ‘나는’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는’은 내 장애인 형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모임입니다. 다른 비장애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지지를 얻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글을 쓰며 진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형제를 잘 돌보는 착한 아이’가 아닌 그냥 ‘나’를요.”(설지영)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