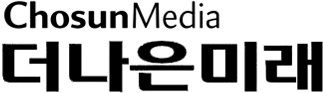‘봉사하는 청춘’을 만나다 탈북 대학생 엄에스더… ‘신개념 꽃거지’ 한영준 ‘수저론’이 한창인 대한민국, 그러나 어떤 곳에선 수저조차 못 물고 태어나는 이들이 있다. 가장 가까운 곳 ‘북한’과 지구 반대편 남미 볼리비아의 빈민촌 ‘뽀꼬뽀꼬’다. 그들에게 ‘나눔’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있다. 바로 대학생 통일 봉사단을 만든 탈북자 엄에스더(33)씨, 7년째 ‘100원의 후원금 구걸’을 하는 ‘꽃거지’ 한영준(32)씨 이야기다. ◇봉사를 통해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한 탈북자, 엄에스더 2010년, 엄에스더(33·한국외대 중어중문학과 4)씨는 두 번 탈북한 끝에 남한 땅을 밟았다. 봉사를 시작한 건 정착 후 한 달도 되지 않아서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 시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노숙인 무료 급식 봉사 등을 빼놓지 않는다. 왜 그럴까. 엄씨는 중국 옌지(延吉)에서 도피하던 시절을 이야기하다 울먹였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눈앞에서 공안에 잡혀가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어 삶을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그때 길에서 사지(四肢) 없는 노인이 입에 붓을 물고 글을 써서 파는 걸 보면서, 제 모습이 부끄러워 용기를 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장애인 시설로 무작정 가 돕고 싶다니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더군요. ‘숨어 사는 사람은 좋은 일도 못 하는구나’ 싶어 서러웠죠.” 엄씨는 남한에 도착한 후, 지인에게 소개받은 장애인 시설 ‘엔젤스헤이븐(구 은평천사원)’부터 찾았다. 봉사의 시작이었다. 토요일 새벽부터 일어나 장애인들을 씻기고, 시설 곳곳을 쓸고 닦았다. 주6일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하루 4시간도 못 자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토요일 봉사는 빼먹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봉사는 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