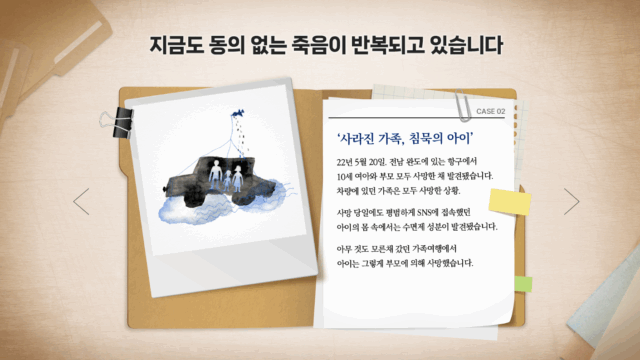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농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어떨까?”다. 나의 대답은 늘 똑같다. “우리 농업이 아주 부족해 보인다는 건 투자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라고.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까지 떨칠 수는 없다. 우리 농업은 “정부의 지원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무게추를 옮겨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다. 그때가 조만간 오긴 하겠지만 언제일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많은 소비자는 미국 농산물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해 생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대규모 기업농이 재배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또한 라오스와 같은 개도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헥타르(ha) 당 370kg의 비료를 사용했지만, 미국은 129kg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단위면적 당 비료 사용량이 많은 국가 중 하나다. 개도국에서는 높은 독성을 이유로 선진국에서 금지된 농약을 다수 사용한다. 반면에 미국은 자연의 재생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제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꼽힌다.
또 하나의 착각 중 하나는 규모화된 농업은 덜 도덕적이고 소농이 더 친환경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역시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생산자들이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의 문제이지 규모와는 상관없다. 이 경우는 오히려 생산 단위의 규모가 클수록 더 유리하다. 단위 면적당 관리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불안감의 근원은 뭘까?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좋은 의도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다.
십여 년 전 개발원조 업계에서는 ‘원조의 저주’라는 말이 크게 회자된 적이 있었다. 선진국의 자선가가 개도국에 지원한 신발과 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도움됐지만, 현지의 영세한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켜 더 원조에 의존하게 했다는 비판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농업미생물 산업을 돌아보자. 우리나라는 유용한 미생물을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20여 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농업미생물은행을 운영하면서 국가가 연구한 미생물 자원을 분양하는 것뿐 아니라 민간이 개발한 미생물까지 보관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분양해주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다. 세계 미생물비료 시장은 2029년에는 5조원에 이를 전망이지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이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기술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미생물비료가 얼마만큼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상품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미생물제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자체 어디를 가도 농업기술센터 옆에는 농기계 임대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취지는 좋았다. 영세농들이 값비싼 농기계를 싼값에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고 농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그렇지만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뭔가 아쉬움이 느껴졌다.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만 지원될 수 있다.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예산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일부 농민들은 돈을 내고서라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이를 제공하는 기업은 없다. 가장 선진화된 산업 국가에서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농업 활동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수세(水稅·농업용수 사용료) 폐지 운동이 농민운동의 큰 성과로 불리지만 요즘 들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몇천원이라도 농업용수 사용료를 냈다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올 한해는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농업에 혁신이 일어나는 한해이길 소망한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