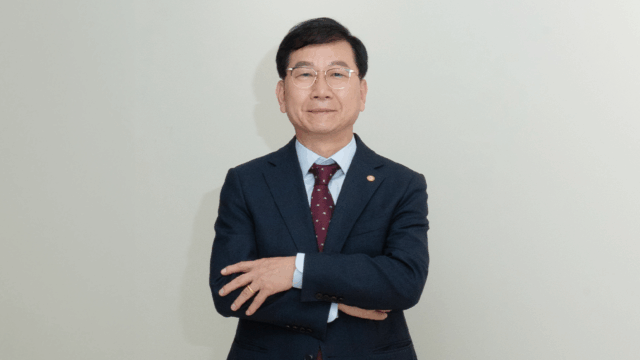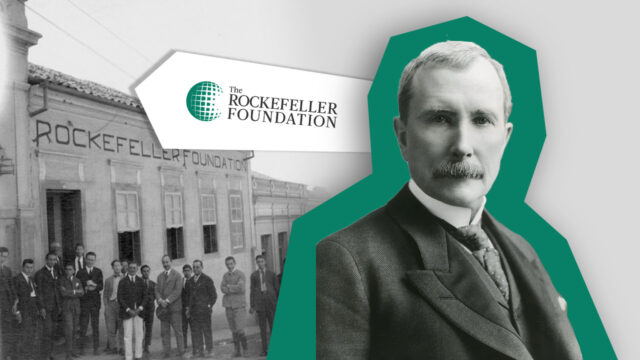우리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고 있을까?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도 자주 들을 수 있다.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완성하는 비재무적 요소를 ESG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일까?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강타하는 기상이변 뉴스가 심상치 않다. 100년만의 기록적 폭우를 쏟아낸 한국, 유럽과 러시아는 최고기온을 갱신했고 영국과 독일, 중국의 일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상고온으로 빙하가 녹아서 알프스산맥의 인기 탐방로인 몽블랑과 마터호른의 일부가 통제됐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2030년, 즉 8년 후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에 등장하기도 했다. 즉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가장 오래된 서사시로 알려져 있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쓰여진 ‘길가메시 서사시(Gilgamesh Epoth)’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원전 2750년경에 실재했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도시국가 중 하나인 우루크의 왕인 길가메시를 주인공으로 한 문학 작품이다. 이 서사시는 환경과 자연을 훼손해 문명이 멸망했다는 단서를 남겼다. 길가메시가 신들에게 반항하며 광대한 삼나무 숲을 벌채한 탓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자라지 못해 살 던 곳을 떠나 바빌론과 아시리아로 피난해야 했다는 것이다.
마야(Maya) 문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고대 마야는 ‘보존의 우주론(A Cosmology of Conservation)’으로 불리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당시 마야인은 의식, 농사, 사냥, 삼림 관리, 사교 활동 등 일상 생활에서 지속가능한 관행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전통적인 마야 세계관은 인간이 그들이 공유하는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책임을 지는 많은 부분, 즉 동물, 새, 나무, 구름, 돌, 흙 등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상 하에 자연을 거스르거나 자연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생물다양성과 자연보존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독일의 한스 칼 폰 카를로비츠(Hans Carl von Carlowitz)가 1713년에 쓴 432쪽 분량의 책 ‘야생나무 재배지침(Silvicultura Oeconomica)’에도 등장한다. 이 책은 과학적 임업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문서로 인간 사회와 자연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했던 ‘지속가능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1700년경 광업과 광업에 종사하는 수천 명의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광산의 광석이 고갈된 탓이 아니라 심각한 목재 부족이 원인이었다. 당시 광업과 광석 제련의 과정에서 나무를 많이 소비해, 광산 주변의 숲이 완전히 사라졌다. 숲을 복원하려는 노력 없이 수십 년 동안 나무가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베어지기 시작한 탓이었다. 수상으로 나무를 이동하는 시스템이 설계돼 먼 산림 지역에서 통나무를 운송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조치는 위기를 연장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결국 목재 가격은 더욱 높아졌고 광산 업체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 이러한 심각한 목재 부족을 경험한 한스 칼 폰 카를로비츠는 천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설명하기 위해 ‘지속가능성(Náchhaltigkei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는 자연의 단기적 사용을 거부하고, 숲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저장, 선택, 보호, 식재, 재성장, 유지 관리·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솔루션, 과학적 세부 사항, 지침 및 실용적인 방안을 제공했다. 그리고 유럽 전역의 임업의 현황을 제시하고 극단적인 기상 조건, 질병, 해충, 인간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기술했다. 또 신중하고 검소한 소비를 주장하고 목재 절약 기술을 권장했다. 주택에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스토브를 사용하거나 제련소에서 용광로를 사용하는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오늘날 대부분 남반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넓은 지역의 급속한 삼림 벌채가 계속되고 있고, 개발된 북반구는 이미 산업화 시대에 대규모 삼림 벌채의 상당 부분을 수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를로비츠가 제안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과학적 임업이 없었다면 유럽 전역과 전 세계 사람들은 지난 몇 세기 동안 목격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재난에 직면했을 것이다.
카를로비츠가 지속가능성이라는 현대적인 이름을 부여한 지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목재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의 부족을 겪고 있다. 전쟁의 이유로, 기후이상의 이유로, 인간의 불합리한 소비활동의 이유로 우리의 삶은 지속가능하지 않게 됐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기업경영을 위해, 경제개발을 위해, 개인의 편의를 위해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지속 불가능한 방법을 택했고,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
앞서 2030년이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잘못됐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1.5도, 2도, 4도 이상 올라도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멸망할 뿐. 제한된 자원을 가진 지구라는 행성에서 영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지속가능한 관리를 해야만 한다. 독일의 지속가능성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마우흐(Christof Mauch)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구는 생존을 위해 인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인간은 지구가 필요합니다”.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