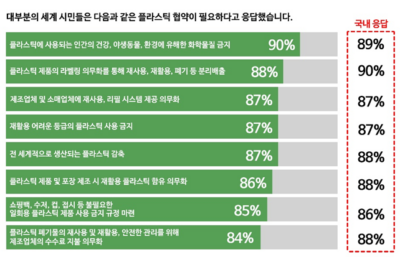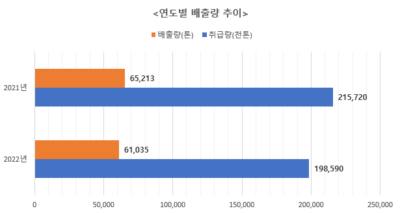환경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미드웨이(Midway) 섬에서 앨버트로스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섬에 도착했을 때 어떤 장면을 보게 될지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섬에 도착해 배 속에 플라스틱이 가득 든 새끼 앨버트로스 수만 마리가 죽은 채로 바닥에 누워 있는 광경을 맞닥뜨렸을 땐.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4년에 걸쳐 미드웨이 섬에서 앨버트로스들의 생애를 카메라로 기록한 미국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56)은 2009년 처음 미드웨이 섬에 발을 디뎠던 때를 회상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크리스 조던: 아름다움 너머’전(展)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성곡미술관. 개막식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전시회 참석차 한국을 찾은 작가를 만났다. 왼손 가운뎃손가락에서부터 손등을 가로질러 새겨진 앨버트로스 날개 모양 타투가 눈길을 끌었다.
“2006년부터 미국의 대량소비문화로 인해 발생한 환경 문제를 고발하는 사진 작업을 해왔어요. 2008년에 환경운동가 친구와 함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공부하던 중, 한 생물학 연구원으로부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미드웨이 섬에 가서 죽은 앨버트로스의 배 속을 보라’는 말을 들었어요. 머릿속에서 ‘댕~’ 하고 종소리가 울리더군요.”
이듬해 미드웨이 섬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우선 눈 아래 펼쳐진 망망대해에 압도됐다. 그는 “이렇게 외딴 섬조차 플라스틱으로 오염됐다니 믿을 수 없었다”며 “몇 주밖에 안 된 새끼 앨버트로스 배 속에서 꺼낸 한 줌의 플라스틱 조각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영상 촬영팀을 꾸려 영화 제작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살아 숨 쉬는 앨버트로스의 모습들을 담고 싶었다. 여덟 번이나 미드웨이 섬을 방문해 400시간 넘는 분량의 영상을 촬영했다.
“영화제작 과정 내내 슬픔, 절망, 무력감과 싸웠어요. 죽어가는 새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이봐, 앞으로 넌 아주 유명해질 거야. 내가 네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거든’이라고 새들에게 말을 건넸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영화를 완성해야 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부리로 몸을 지탱하는 앨버트로스를 촬영할 때였어요. 살기 위해 안간힘 쓰는 모습에 눈물이 쏟아져 앞이 안 보이고, 어깨가 마구 들썩였죠. 옆에 있던 동료가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크리스, 카메라가 흔들리면 안 돼. 우린 이 장면 잘 찍어야 해’라고.” 이 과정을 거쳐 탄생한 작품이 지난해 개봉한 1시간 37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 ‘앨버트로스(Albatross)’다.

이번 전시에서는 초기 사진 연작부터 그가 세계적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된 미드웨이 섬에서 찍은 사진 시리즈인 ‘미드웨이’와 영화 ‘앨버트로스’, 체코의 보호림(保護林)인 슈마바(Šumava)의 풍경을 담은 최신작 ‘슈마바’까지 대표작 64점이 소개된다.
“슈마바 숲은 120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은 적 없는 청정한 숲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숲에 도착했을 때, 걷잡을 수 없이 벌목이 진행돼 있었어요. 가장 깊은 곳, 가장 외진 곳을 찾아들어가도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어른 키 높이도 안 되는 나무 밑동과 그와 비슷한 키의 어린 묘목들뿐이었죠. 남아 있는 나무들도 건강하지 못했어요. 딱정벌레가 들끓어 나무들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숲에 벌레가 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다만 나무들이 워낙 연약하니까 벌레의 습격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설적인 숲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섬과 슈마바 숲에서 카메라로 포착하고자 했던 건 ‘사랑’이다. 그는 “죽어가는 앨버트로스 앞에서, 파괴된 슈마바 숲에서 ‘비통함’을 느끼는 건 결국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겠죠. 죽어가는 새, 파괴된 숲을 위해 무언가 행동을 하려면 그것들을 사랑하고, 슬픔, 공포, 분노의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가 앨버트로스의 기다란 두 날개가 새겨진 왼손을 쫙 펴며 말했다. “우리가 세상의 일부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너무도 간단하고 명확해서 오히려 쉽게 잊히는 이 사실을 모두가 기억해낼 때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